[535호 2022년 10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세상 두루 돌아보고 이제 고향 인천에 여생 바칩니다”
“세상 두루 돌아보고 이제 고향 인천에 여생 바칩니다”
신용석 (농화학61-67)
인천향토사연구회장·인천개항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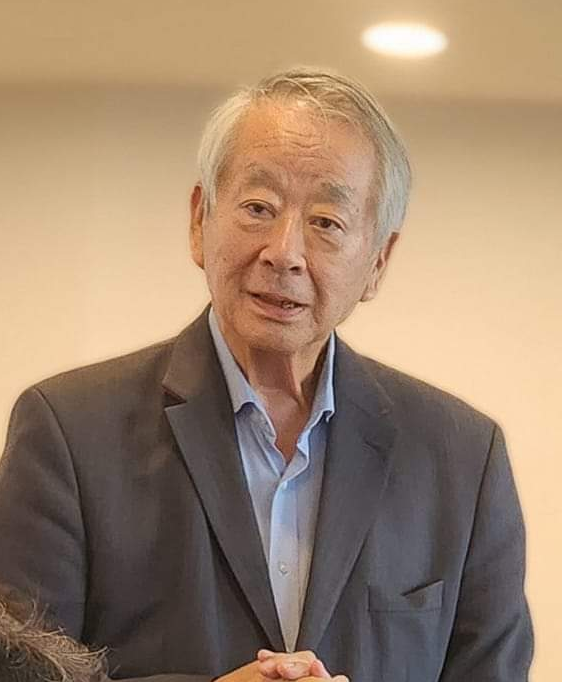
3대째 인천토박이, 은퇴 후 귀향
지역지 칼럼 연재 1000회 돌파
“25세까지 성장하며 배웠고, 50세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다. 나머지 25년은 봉사하며 살겠다.”
1991년 11월 19일,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던 신용석 동문은 25년 다닌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나이 50세, 두 차례 파리특파원과 외신부장, 사회부장을 지냈다. 관록을 뒤로 하고 향한 곳은 고향 인천이었다.
그 후 줄곧 인천을 위해 살았다. 인천향토사연구회를 만들고,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위원장으로 대회 유치를 이끌었다. 인천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정비해 문화 유적으로 보존하는 데 앞장섰다. 전국지에서 지역지로 바뀌었을 뿐 펜을 놓지 않았다. 인천일보에 30년 가까이 칼럼을 써왔다. 2008년부터 ‘신용석의 지구촌’이란 표제로 연재한 칼럼만도 1000회를 훌쩍 넘겼다.
자타가 공인하는 ‘인천의 대표 언론인’ 신 동문을 9월 28일 인천 개항장 거리에서 만났다. 점심식사를 겸한 인터뷰는 단골식당과 100년 넘은 건물이 즐비한 원도심 거리, 그가 관장을 맡은 인천개항박물관 등 그에겐 손바닥같이 훤한 곳곳에서 이뤄졌다.
“3대 아닌 10대를 살아도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러셨듯이요.” 그의 조부는 대한제국 근대식 군함의 효시인 양무호와 광제호 함장을 지낸 신순성씨. 국운이 다하며 두 배는 사명을 잃었지만 조부는 서울 종로에 살던 가족을 이끌고 두 배의 모항(母港) 인천에 자리 잡았다. 그 애환을 알아서일까. 인천 최초 의학박사인 선친 신태범(1936년 경성제대 의학부 졸업) 동문도 서울에서 개업을 마다하고 인천에 ‘신외과’를 차렸다.
신 동문도 여러 번 타지에 정착할 기회가 있었다. 대학 시절 대학신문 편집장을 지냈고 영어를 잘하는 덕에 학생 대표로 미국, 일본, 스웨덴 등에 초청받아 다녔다. 졸업반 무렵엔 미국 정부에서 장학금과 함께 유학 제의를 받았다.
“마침 미국 정부 초청으로 서너달 미국 여행을 하면서 홈스테이 중이었어요. 한국전쟁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이웃이 저를 초대하더군요. 가보니 전사한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에요. 저녁 먹는 내내 ‘아임 쏘리, 아임 쏘리’만 했죠. 집을 나설 때 그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그래요. ‘미스터 신,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 그게 우리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다음날 대사관에 유학 포기하겠다고 연락했죠.”
그후 파리 7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3년간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늘 뿌리를 생각했다. 국내 체육계 인사들 대신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에 해외 작품 전시가 드물던 시절 조선일보 주최 루브르 박물관전, 오르세 미술관전 등 10여 차례 프랑스 미술전을 성사시켰다. 프랑스 정부 문화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체육훈장 맹호장 등을 받았다. “그 분이 내겐 은인이죠. 다른 나라에서 어물거리지 않고 한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애향심 약하다는 인천에서 신 동문은 ‘희귀 케이스’일지 모른다. 해방 후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 전후로는 북한에서까지 몰려와 닥치는 대로 일감을 찾았고 살 만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인천을 떠났다. 인천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고향을 등지는 경향이 만연한 사실을 그는 개탄했다. “프랑스에선 수도권에 정착해도 할 일이 끝나면 집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파리에 살 때도 교외에 주말 집을 마련해 2~3일씩 다녀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죠. 그런 식으로 사회 통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수도권에 올라오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취미도 서울 근교 산과 골프장을 벗어나지 않고, 은퇴하면 서울 주변에 머물려 애쓰고. 이게 계속되면 지방은 완전히 소멸할 텐데 누구도 목소릴 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와 똑같이 하기는 어려울 터임을 알고 있다. 자신도 한때 “고향에 연착륙하기 위해” 정치를 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시장 하러 왔겠지’ 하던 시선이 실패해도 인천을 떠나지 않으니까 바뀌더군요. 이젠 오히려 당선된 것보다 훨씬 좋아요. 꼭 고향에 돌아가란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란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말라’던 집안 가르침 덕에 오래된 자택 외엔 인천에 건물 한 채 가진 게 없다.

신 동문의 활동 터전인 인천 개항장 거리
칼럼 하나를 써도 국가와 지역 현안에 자신의 경험을 엮어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제언을 하려 골몰한다. 회고록 한 권 쓸 법도 한데 인천일보에 쓴 칼럼을 엮어 갈음하겠다고 했다. “아버지 영향이에요. 살면서 만나는 이마다 귀중히 생각하란 말을 듣고 자랐죠. 당신께서 인천사의 주요 저서로 꼽히는 ‘인천 한 세기’를 집필하셨는데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의사 생활 하시면서 각계각층 인천 사람을 만난 경험으로 쓰신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선친의 병원이 있던 자리라며 안내한 건물엔 우연히도 작은 극단이 들어와 신태범 동문과 그가 교우한 인천 예술인을 소재로 행사를 준비중이었다.
신 동문의 얘기를 들으며 중국의 문인 유신이 고향을 생각하며 썼다는 시구 ‘음수사원(飮水思源)’이 떠올랐다. 흐르는 물처럼 세상을 주유했지만 근원을 잊은 적 없다. 팔순을 넘긴 지금도 처음 다짐처럼 고향을 위해 일하고 있다.
최근엔 ‘인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100여년 전 조부가 부푼 가슴으로 배를 몰고 왔던 인천 내항을 시민 공간으로 돌려주려 노력하고 있다. ‘재개발’ 아닌 ‘재정비’로, 아파트 올리는 일만 지역 발전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그가 고향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