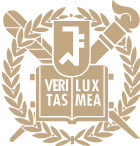[434호 2014년 5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李 孝 元교수

朴槿惠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과 `드레스덴 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李孝元(공법83 - 87)교수가 통일 전문가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李孝元동문에게는 `국내 통일법 교수 1호'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닌다. 국내에 통일법이란 전공이 없던 2007년 당시 모교 교수로 부임해 통일법 전공을 만들고 강좌를 개설하는 등 제도화를 시켰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그의 주도로 모교에 헌법·통일법센터가 설립됐다. 지난 3월에는 `통일법 총서1 : 통일법의 이해'를 발간했고, 학부생들의 요구에 따라 통일법 공개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2일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李동문은 막 독일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지만 피곤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李동문은 “북한 문화재 관련 워크숍이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열려서 다녀왔다”며 반갑게 기자를 맞이했다.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경계도 합니다. 남북현실이 이렇게 논의될 만큼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이럴수록 한 템포 쉬어가면서 통일법 연구에 매진해야겠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통일법이란 뭘까? 책 `통일법의 이해'에는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을 규율하는 일련의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통일법은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하는 수단이다. 이와 동시에 통일 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견인하는 규범적 기준이기도 하다'고 적혀 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통일법이 아직 독자적인 학문으로 확립되지 않아 범주 설정에 어려운 면이 있죠. 통일 과정을 생각해보면 분단 상태에서 교류협력, 통일이 완성된 다음 법률 통합, 사회심리적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모두 통일법 범주에 들어요. 구체적으로는 남북합의서, 개성공업지구·북한이탈주민 관련법, 북한 인권법,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등이 있죠.”
설명을 듣다 문득 6·25전쟁 때 북에서 남한으로 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소유했던 토지는 통일 이후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해졌다.
“독일의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가 몰락할 당시 우리에게 독일이 통일 모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작용이 나오고 또 독일과 달리 우리는 전쟁을 겪고 근대국가를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독일 모델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북한의 경우 토지대장이 일제 청산 작업을 거치며 대부분 소멸됐어요.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 두 번째 현실적인 증명의 문제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李동문이 통일법 학자가 된 과정이 특이하다. 대학 졸업 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98년 통일부의 통일대비 기획요원으로 선발돼 체코에서 `공산당 치하 피해 국민의 회복 지원'에 관한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통일과 인연을 맺었다. 검찰로 복귀한 후 다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으로 연수를 떠나 `독일 통일 10년의 법적 통합'에 대한 주제로 1년간 공부했다.
결정적으로 그가 통일법 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2003∼2006년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에서 근무하면서부터다. 북을 적으로 대하는 공안검사로 10여 년을 활동하다 정반대의 위치에서 남북합의서와 교류협력법 등 각종 협의서 체결을 위해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본질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남북문제가 정치영역이 아닌 법치주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당시 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해 직접 뛰어들어 모교 金哲洙·成樂寅교수의 지도 하에 통일법 관련 논문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앞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 李동문은 “통일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선별해 책자로 계속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떤 정권도 핵이나 식량지원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머지않아 북한에도 변화가 올 겁니다. 그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일법 총서를 발간해 법제도면에서 그 책들을 보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이건 모르고 있었네'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