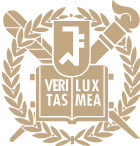[403호 2011년 10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서울대여…”, “서울대여…”

얼마 전에 安哲秀(의학80 - 86)동문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됐다. 초강력 태풍이었다. 설만으로 온 사회가 대지진을 맞은 양 요동을 쳤다. 원인을 두고 분석은 백인백색이었다. 한 가지 소득은 우리 사회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었다.
安哲秀동문 얘기를 끄집어 낸 것은 지난 3월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의 그의 발언이 어제 일처럼 귓가를 맴돌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그는 IT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개가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이라는 동물원에 갇힌 것과 같다는 비유를 했다. 논리에 얼마간의 비약과 과장은 있었다. 그럼에도 참석자 대다수가 그의 현실진단에 고개를 끄덕였다. 반응이 뜨거웠다. 安哲秀신드롬의 싹은 그 때부터 자라고 있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을 보자면 재벌 동물원에 갇힌 것은 중소기업만이 아니다. 적지 않은 고위관료, 법조계, 대학 교수 등 지식인도 동물원 식구가 됐다. 재벌의 사육사, 조련사가 던져주는 먹이에 꼬리를 흔들고 장단을 맞춘다. 언론도 그 동물원의 재롱둥이로 변신한 것 같다.
2∼3주에 1∼2번씩 만나는 개인적인 언론인 모임이 있다.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한겨레는 안 들어갔지”하고 진반, 농반의 질문을 던졌다. 아뿔싸. 한겨레신문의 후배는 “우리도 상체는 이미 동물원에 들어갔어요”한다. 처연한 표정과 씁쓸한 말투 속에 슬픔이 배어나왔다.
한국지성의 본산이란 모교도 동물원에 갇힌 게 아닌가 의문이 떠올랐다. 서울대에게는 선지자, 선각자, 예언자적 역할과 사명을 요구한다. 어려웠던 유신시절, 권위주의 정부 시절 서울대는 그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 예언자의 풍도가 엿보였다.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피난처가 돼 주었다. 서울대가 서울대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는 아닌 성싶다. 많은 이가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강남좌파'도 더러 있다지만 지적 허영과 사치의 인상이 강하게 풍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많이 팔렸다지만 서점가의 일일뿐이었다. 오늘의 모순과 병리 현상에 눈감고 있다. 예레미야나 아모스의 치열한 모습은 오간 데가 없다. 대기업의 사외이사, 고문, 자문역 등을 맡거나 거액의 연구용역을 받다보니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정반대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서울대가 참 모습을 상실한 것이다. 쓰러진 정의는 누가 세울 것인가.
서울대는 하루 속히 재벌 동물원에서 탈출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서울대여…”, “서울대여…”하고 부르짖는 애절하고 구슬픈 통곡이 환청만은 아니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