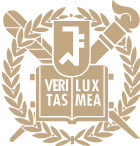[395호 2011년 2월] 오피니언 동문칼럼
로봇, 과학과 인문학 융합의 정점

과학에 대한 인간의 탐구는 지속돼 21세기에 들어 학제적으로 수평적 통합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융합적 통섭(confluent consilience)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첨단기술 컨버전스가 대세가 됐다. 또한 정부는 융·복합시대에 맞추어 경쟁적으로 융합창발형 조직을 구축·운영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로봇이다. 실제 로봇은 전자, 기계, S/W, 나노, 바이오 등 여러 공학 기술이 조합돼야 탄생할 수 있고 뇌과학, 분자생물학 등 자연과학과의 융합이 더해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 이 로봇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문학도 연계돼야 한다. 한국로봇학회 회원으로 법률, 의료, 문학,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21세기 들어 소득수준의 상향, `well-being' 라이프 추구, 출산율 감소, 고령화 등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제반 산업의 틀도 변화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은 이러한 메가트랜드에 대해 Multi Value Chain산업이 될 로봇을 활용해 대응을 시작하고 있고, PC혁명을 이끈 빌 게이츠가 로봇의 급격한 성장을 예견했듯이 많은 미래학자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이 천문학적인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그 흐름을 타지 못하거나 탈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SF영화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과 다름없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요소기술 분야별 원천기술이 3∼5년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핵심기술의 적지 않은 특허도 미국 및 일본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 기간 제조용 로봇 1위인 일본은 그 시선을 서비스로봇으로 옮겨둔 상태이며, 미국 또한 NASA, 국방부 등을 통해 축적된 우주, 군사분야 첨단기술을 민군 협력을 통해 이전하고 있다. 유럽은 EU차원에서 로봇분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와 로봇인들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었다. 비록 IMF로 인한 투자가 주춤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2003년 이후 로봇분야 르네상스라 할 정도로 R&D, 비R&D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연구개발과 급격한 산업성장이 이뤄져 왔다. 우리가 선진국과 원천기술의 격차는 있으나 다양한 응용경험과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첨단기기의 수용력이 탁월해 이미 로봇의 상용화를 뛰어 넘어 R-learning 같은 Servitization을 교육현장이라는 수요처에 적용하고 있다. 로봇과 연계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잘 할 수는 없다. 우린 우리만의 장점이 활성화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된다. 결국 첨단기술분야는 지키는 것보다 누가 먼저 시도하고 선점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로봇이 있다. 걷고 뛰는 `아시모', `마루' 외에도 인공지능과 센서가 탑재된 에어컨로봇, 청소로봇이 필수 혼수품으로 선택돼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골퍼들이 애용하는 스크린골프의 프로그램과 기기들에 로봇기술이 적용돼 있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은 2020년에 로봇군단을 창설하겠다고 했다. 卜鉅一의 소설 `애틋함의 로마'에서 한 노신사가 아내와 사별한 뒤 집안 일을 맡은 가정부로봇에 정이 들어 `생명연장시술'을 받을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