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호 2026년 1월] 오피니언 관악춘추
‘내 편’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
진영논리가 미치는 해악 커, 진리만이 나아갈길 밝혀줘
‘내 편’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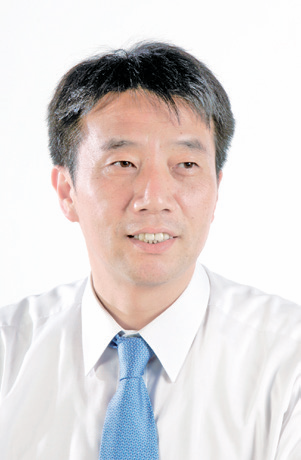
김창균(경제80)
조선일보 논설주간
본지 논설위원
진영논리가 미치는 해악 커
진리만이 나아갈길 밝혀줘
정치 현장 취재에서 물러난 지 제법 세월이 흘렀다. 지난 해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국회가 소란스럽다고 해서 관련 청문회들을 유튜브로 들여다 봤다. 목소리 크기로 소문난 의원 몇몇이 증인을 앉혀 놓고 호통치는 모습은 예전이랑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런데 몇몇은 너무나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저렇게 엉터리 논리로 목청을 높였다가 탄로가 나면 망신스러울 텐데…” 싶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였다. 진실과 동떨어진 음모론을 들고나와서 고래고래 고함친 의원들이 오히려 청문회 스타로 칭송받고 있었다. 그 의원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유튜브 제목은 “△△△의원 사자후에 정신줄 나간 ○○○” 식으로 편집 됐다. 댓글은 의원들을 추켜세우는 낯 뜨거운 찬사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청문회 스타라는 영예로운 별칭은 1988년 11월 사흘 동안 진행된 ‘5공 비리 청문회’에서 활약한 노무현 의원에게 처음 선사됐다. 노 의원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모금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예의를 갖춰 논리적으로 파고들면서 “기업인은 시류에 따라 산다”고 방어막을 치던 정 회장으로부터 “바른 말 하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생방송으로 이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필자가 20년 전 국회 현장을 담당할 때까지 기억했던 청문회 스타는 이런 모습이었다. 차분하게 따박 따박 증거와 논리로 증인의 잘못을 추궁하고 시인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 속 알맹이 없이 호통만 치는 의원들은 오히려 청문회 민폐 배역으로 비판받는 축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일까. 요즘 국회 현장은 1분도 채 안되는 분량의 쇼츠 영상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의원은 고함치며 분노하고, 상대방은 새파랗게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하는 짧은 전개면 충분하다. 아니, 그 이상 늘어지는 동영상은 사족에 불과하다. 우리 정치의 소비 행태는 누가 옳은지를 차분하게 따져 보는 합리적 판단을 떨쳐 낸 지 오래다. 우리 편이 무조건 옳고, 우리 편이면 옳아야 한다는 점을, 이론을 펼쳐가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옳고 그른 것 대신에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먼저 따지는 진영 논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크기는 말로 헤아리기 힘들다. 신뢰 자본을 키울 풍토가 바닥난 사회가 정신적 발전을 이뤄내기 힘들다는 것은 논증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만이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는 서울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새해 아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