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호 2025년 11월] 문화 신간안내
회계 전공 살려 직장 생활 만족도 국내 첫 수치화
저자와의 만남
회계 전공 살려 직장 생활 만족도 국내 첫 수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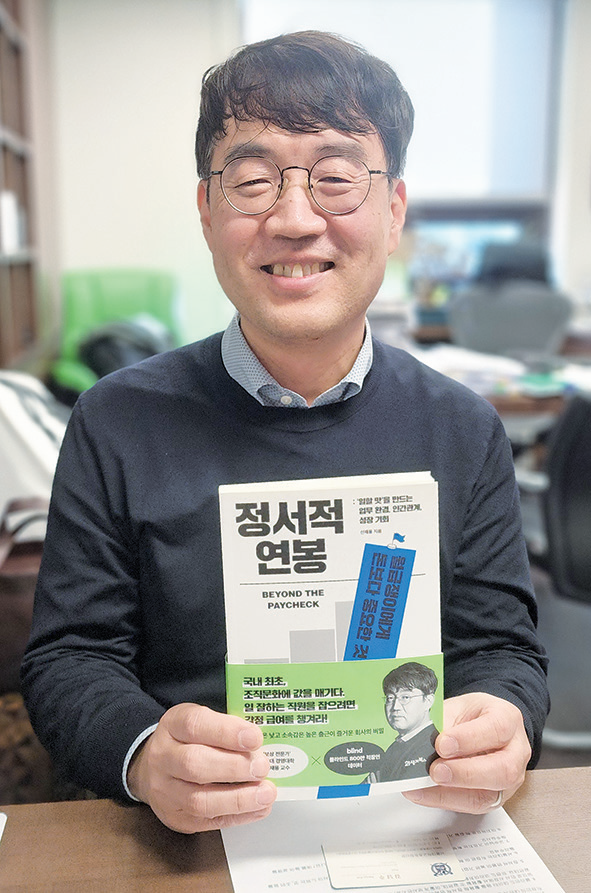
‘정서적 연봉’ 쓴 신재용 교수
신재용(경영90·사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신간 ‘정서적 연봉’(21세기북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일할 맛’을 수치로 보여준 첫 시도란 평이다. ‘정서적 연봉’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10월 27일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서울대가 주는 정서적 연봉이 크기에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요즘 서울대 교수들이 떠나간다는 기사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대 교수의 이직률은 낮은 편입니다. 서울대 교수 평균 연봉이 높지 않은데 왜 남아있을까.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 환경, 훌륭한 동료와 학생들, 그리고 나 스스로 서사를 부여할 수 있는 일, 서울대라는 브랜드 등 정서적 연봉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연봉’이 중요한 이유로 그는 “화폐적 연봉 경쟁은 한계가 있지만 정서적 연봉 경쟁은 사측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0년이 넘어가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인재를 모시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정서적 연봉이 높은 회사가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대학원생 절벽’이라 불리는 현장에서 미래 인재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이제 학생이 교수를 쇼핑합니다. 예전엔 교수가 학생을 뽑았다면 지금은 반대예요.”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일본은 2010년대 들어 인구 절정에서 15% 줄자 인재난이 폭발했어요. 지금은 구직자가 면접관을 고르고, 회사가 부모에게 ‘귀댁의 자녀를 채용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대학원에서 현재 그 현상이 시작됐고 2030년 이후엔 기업이 인재를 모시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한 무기는 돈이 아니라 정서적 가치란 이야기다.
정서적 연봉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다. 800만 직장인의 리뷰를 정량화해 일할 맛을 화폐 가치로 환산했다. 그의 데이터 감각은 ‘회계학자’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모두 말하지만, 수치화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부족해도 일단 해보자’는 입장이었죠.”
책은 ‘정서적 연봉이 높은 기업 Top 30’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상장·비상장사 중 데이터를 확보한 200여 개 기업을 분석했다. 하이닉스, 포스코인터내셔널, LG에너지솔루션, 남동발전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였어요. 업무 자율성과 심리적 안전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관용이 높은 곳이죠.” 신 교수는 “순위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좋은 곳은 알려야 한다는 마음에 상위 30 기업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신 교수는 책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데이터가 상장 기업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대형 기업 위주로 분석하게 된 점이 아쉽죠. 블라인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신 교수는 “정서적 연봉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길 바란다”며 “블라인드와 계속 협업해 정서적 연봉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정서적 연봉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
회계 전공 살려 직장 생활 만족도 국내 첫 수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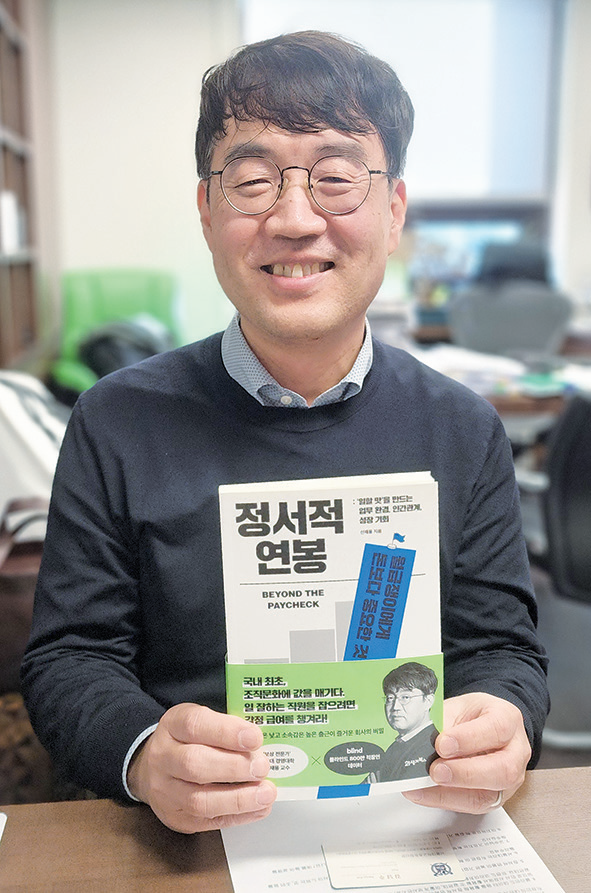
‘정서적 연봉’ 쓴 신재용 교수
신재용(경영90·사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신간 ‘정서적 연봉’(21세기북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일할 맛’을 수치로 보여준 첫 시도란 평이다. ‘정서적 연봉’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10월 27일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서울대가 주는 정서적 연봉이 크기에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요즘 서울대 교수들이 떠나간다는 기사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대 교수의 이직률은 낮은 편입니다. 서울대 교수 평균 연봉이 높지 않은데 왜 남아있을까.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 환경, 훌륭한 동료와 학생들, 그리고 나 스스로 서사를 부여할 수 있는 일, 서울대라는 브랜드 등 정서적 연봉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연봉’이 중요한 이유로 그는 “화폐적 연봉 경쟁은 한계가 있지만 정서적 연봉 경쟁은 사측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0년이 넘어가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인재를 모시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정서적 연봉이 높은 회사가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대학원생 절벽’이라 불리는 현장에서 미래 인재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이제 학생이 교수를 쇼핑합니다. 예전엔 교수가 학생을 뽑았다면 지금은 반대예요.”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일본은 2010년대 들어 인구 절정에서 15% 줄자 인재난이 폭발했어요. 지금은 구직자가 면접관을 고르고, 회사가 부모에게 ‘귀댁의 자녀를 채용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대학원에서 현재 그 현상이 시작됐고 2030년 이후엔 기업이 인재를 모시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한 무기는 돈이 아니라 정서적 가치란 이야기다.
정서적 연봉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다. 800만 직장인의 리뷰를 정량화해 일할 맛을 화폐 가치로 환산했다. 그의 데이터 감각은 ‘회계학자’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모두 말하지만, 수치화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부족해도 일단 해보자’는 입장이었죠.”
책은 ‘정서적 연봉이 높은 기업 Top 30’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상장·비상장사 중 데이터를 확보한 200여 개 기업을 분석했다. 하이닉스, 포스코인터내셔널, LG에너지솔루션, 남동발전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였어요. 업무 자율성과 심리적 안전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관용이 높은 곳이죠.” 신 교수는 “순위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좋은 곳은 알려야 한다는 마음에 상위 30 기업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신 교수는 책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데이터가 상장 기업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대형 기업 위주로 분석하게 된 점이 아쉽죠. 블라인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신 교수는 “정서적 연봉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길 바란다”며 “블라인드와 계속 협업해 정서적 연봉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정서적 연봉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