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호 2025년 8월] 오피니언 논단
세계정치학계가 주목한 ‘한국 정치’
7월 여름 세계 정치학자 3370명,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모여 헌정 질서 회복한 한국민주주의, ‘제1회 김대중상’도 제정해 수여
세계정치학계가 주목한 ‘한국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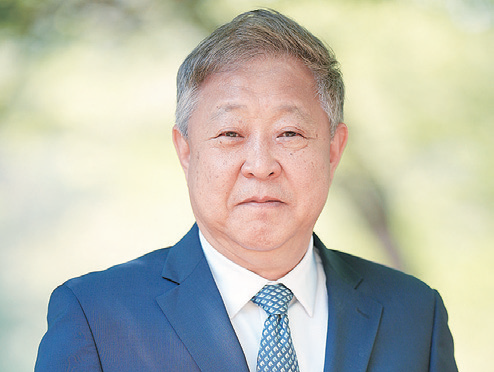
김의영
정치80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7월 여름 세계 정치학자 3370명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모여
헌정 질서 회복한 한국민주주의
‘제1회 김대중상’도 제정해 수여
2025년 여름,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 정치학계의 중심이 됐다. 1997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정치학회(IPSA) 총회를 개최한 이후, 약 3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린 서울총회는 아시아 최초의 ‘두 번째 개최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국 정치학의 현재와 미래를 세계에 선명히 각인시킨 자리였다. 일단 규모 면에서 역대급이었다. 지난 7월 12일에서 16일까지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총회에는 전 세계 95개국에서 온 3370명의 정치학자가 776개의 패널을 조직하여 305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IPSA 총회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우선, 한국의 국력과 서울의 매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의 시대에, 작년 12월 3일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보여준 저력, 즉 시민의 힘으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 낸 우리 민주주의의 ‘굳건한 힘(resilience)’이 큰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번 총회는 질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도약이었다. 첫째,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학의 학문적 수월성과 리더십을 전 세계 정치학계에 널리 알린 기회가 됐다. 한국 조직위원회(LOC)는 19개의 트랙, 108개의 패널을 독립적으로 기획·조직하며,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 모두를 담아냈다. 한국은 단지 개최국을 넘어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387명의 한국 정치학자가 주요 패널과 기조 세션에 대거 참여하여 한국 정치학의 성과를 세계 무대에 자신 있게 선보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권형기 교수가 아시아 최초로 권위 있는 칼 도이치 상(Karl Deutsch Award) 을 받았다.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는 IPSA 최초로, 아니 어쩌면 세계 학계 최초로, 정치인의 이름을 딴 상인 ‘김대중상(Kim Dae-jung Award)’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철학적 정치가(Philosopher Statesman)’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상이다. 학문적 수월성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세계적인 대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캐나다 맥길(McGill) 대학의 타자 바키 폴(T.V. Paul) 교수가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제 우리 정치학계가 우리의 기준으로 세계적인 상을 제정해 외국 학자에게 수여한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 학계가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는 뜻의 표현이었다.
둘째, 서울총회는 학문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된 시의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실천적 공간이기도 했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권위주의에 맞서기(Resisting Autocratization in Polarized Societies)”라는 주제 아래, 세계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우선 가장 눈에 띄고 언론의 조명을 받은 건 첫째 날, 개회식 대통령 연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K-민주주의(K-democracy) 기조연설은 한국 민주주의의 고유한 특성과 국제적 기여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며, 큰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둘째 날, 김대중 상 수상식의 김민석 국무총리 연설과 라운드테이블, 셋째 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설 및 선거 신뢰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그리고 마지막 날, 폐회식 우원식 국회의장 연설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할에 대한 세계 주요 정치학회장 라운드테이블 등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과 역할을 논하는 각종 고위급 세션이 조직됐다. 서울대 유홍림 총장이 주도한 패널로서, 세계 각국 고등교육기관과 정치학회 지도자들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학계의 역할을 주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 또한 이번 총회가 단지 학문 발표의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줬다.
셋째, 이번 서울총회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함께 웃고, 토론하고, 우정을 나눈 축제의 장이기도 했다. 서울대 음대 국악과 김승근 교수의 도움으로 개막식의 국립무용단 공연, 아시아의 밤(Asian Night) 행사, 국악 퓨전 음악과 어우러진 폐회식 만찬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수준의 문화 행사를 준비했으며 이번 세계대회를 단순한 학술 행사 이상의 기억으로 남게 했다.
서울에서의 IPSA 총회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한국 정치학은 이번 총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다시금 확인시켰고, 향후 세계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학의 진보를 위한 주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