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호 2025년 4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길거리 피아노
즉석 거리연주 펼치는 중장년희망·확신 넘쳤던 시대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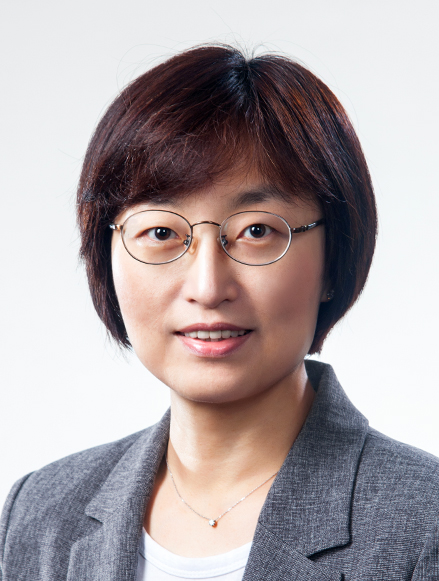
이지영 (약학89-93) 중앙일보 문화스포츠부국장본지 논설위원
길거리 피아노
느티나무 광장
이지영 (약학89-93) 중앙일보 문화스포츠부국장본지 논설위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길거리 피아노’가 있다. 평범한 업라이트 피아노다. 지나가는 누구나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용감하게 즉석 콘서트를 펼치는 이들 중 중장년 비율이 의외로 높다. 그냥 뚱땅거리는 수준이 아니다. 프로 피아니스트들의 리사이틀 연주곡 목록에 들어있음직한 클래식 선율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들이 유년시절을 보낸 1970∼1980년대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꿈에 부푼 시대였다. 자식들만큼은 거실에 피아노를 두고 모차르트와 쇼팽과 슈베르트를 연주하는 여유를 누리며 살 것이란 희망과 확신이 있었다. 학교만 다녀오면 노는 시간이 지천이었던 아이들은 피아노 가방을 들고 부지런히 학원을 오가며 선진국 국민이 될 준비를 했다.
최근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글로벌 1위에 올라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피아노 얘기가 나온다.결혼 준비에 들뜬 애순(아이유)과 관식(박보검). 그림같은 제주의 유채꽃밭에서 이들은 “부자 되면 2층 양옥집에 뽀삐 같은 강아지도 키우고 애들 피아노도 가르치겠다”고 장래희망을 이야기한다.
때는 1968년. 이런 부모의꿈을 안고 태어난 딸 금명은 서울대 영문학과 87학번이 된다. 성공한 자식농사 판타지의 드라마적 구현이다. 1970년생인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어린시절 추억에서도 피아노의 몫이 크다. 반찬 투정도, 용돈을 달라고 떼를 쓰지도, 유명 상표 운동화를 신고 싶다고 조르지도 않았다는 작가가 꼭한번 부모에게 요구했던 일이 피아노 학원에 보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당시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작가는 문방구에 가서 10원짜리 종이 건반을 산다. 그 건반을 책상 위에 붙여두고 소리 없는 연주를, 혼자 고개를 까딱거리며 신나게 했다고 그는 첫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노래’(2007)에서 밝혔다. 이 책에서 피아노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진다.
작가가 중학생 2학년이던 해 가을쯤부터 집안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임권택 감독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히트작 ‘불의 딸’이 1983년 출간됐는데 아마 이 무렵이아닐까 짐작된다), 중3 봄방학부터 피아노학원에 다니게 된다. 딸의 종이건반 연주가 늘 마음에 걸렸던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였다.“배우기 싫어도 엄마 아빠를 위해 1년만 다녀줘라. 배워보고 재미있으면,피아노도 사주마.”한강 작가는 그날의 대화 분위기를 ‘숙연’했다고 표현했다.
작가와 동년배인 나 역시 피아노에 진심이었던 그 시대 분위기를 기억한다. 하긴 어디 피아노에만 진심이었을까. 웅변학원에선 “이 연사, 소리 높여힘차게 외친다”는 대중연설을 가르쳤고, 줄리앙·아그리파 등 인물상 소묘는 할 수 있어야 미술 좀 배웠구나 했다. ‘7세 고시’ 운운하며 대학 입시에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유아기부터 따지는 요즘 세태의 기준에선 대책없이 낭만적인 풍경일 수도 있겠다.
서울 시내 길거리 피아노는 세종문화회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학로마로니에 공원과 서울숲, 노들섬, 뚝섬한강공원 등 서울문화재단이 ‘피아노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피아노만도 모두 13대다. 한데 나와앉아 폭염과 혹한을 견뎌야 하는 피아노로선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관리 역시 쉬울 리없다. 눈·비 오는 날마다 커버를 씌워야 하고, 조율도 한 달에 두 번이나 한다. 그래도 반응은 좋다. 길거리 피아노 위치를 표시한 지도나 연주 동영상등을 공유한 인터넷 게시물이 꽤 많다.
요즘 일본에선 길거리 피아노를 두고 존폐 논란이 빚어진다고 한다. 실력 떨어지는 연주자의 피아노 소리가 듣기 괴롭다는 불만이 나오면서다. 층간소음 시비에 가정용 피아노의 입지도위축된 시대다. 길거리 피아노의 낭만마저 사라질까 두렵다.


